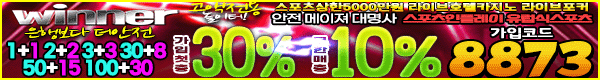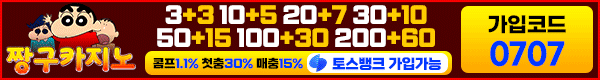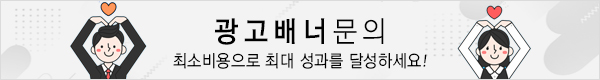친구에게 빼앗긴 엄마 - 4부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677 조회
-
목록
본문
친구에게 빼앗긴 엄마장기간의 외유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많은 분들의 댓글과 쪽지가 남겨져 있더군요.
(일본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전용선 깔린 곳도 거의 없고 소라에 접속도 잘 안되더군요.)
제 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은 채
채 풀리지도 않은 여독을 뒤로 하고 바로 PC 앞에 앉게 되네요.(4부는 짧게 올리겠습니다.)
외국 다녀온 일들을 정리 하느라 연초는 정신이 없을테고 세째 주에 다시 일본에 열흘정도 다녀 와야겠기에
글을 자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짬 나는대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댓글과 쪽지로 힘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친구에게 빼앗긴 엄마 - 네번째 이야기
때를 모르고 찾아온 매미들의 이른 울음 소리 때문일까?
6월의 끝자락으로 접어들면서 날씨는 벌써 완연한 여름을 느끼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시장 통을 방불케 했고 그 한편에 한주가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야, 최 한주. 너 밥 안 먹어?”
“별로 생각 없어. 내 꺼 니네가 다 먹어.”
“너 요새 왜 그래? 꼭 정신 나간 애 같애. 벌써 더위 먹었냐?”
기영과 엄마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후 한주의 머리는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영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엄마에게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아니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던 한주의 눈에 낯익은 차 한대가 들어왔다.
학교 울타리 밖으로 골목에 주차 되어있는 하얀색 벤츠였다.
‘엄마가?…’
순간 한주는 무엇에 홀린 듯 교실을 빠져나가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울타리 밖으로 보이는 승용차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번의 불길한 예감이 한주의 머리를 스쳤다.
운동장을 단숨에 가로질러 학교로 다시 들어온 한주가 옆의 반의 기영을 찾았다.
역시 기영은 4교시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어떡하지? 찾아봐야 되나?’
계단을 내려오던 한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영의 아지트인 미술실 옆에 있는 미술 재료 창고로 향했다.
미술실이 본관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있어서 기영과 몇몇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담배도 피우고 수업도 땡땡이 치던 곳이었다.
창고에 조금씩 가까이 다다르자 나지막이 속삭이는 사람의 소리가 점점 선명히 들리기 시작했다.
한주가 창고의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역시
기영과 엄마의 목소리였다.
순간 한주는 가슴이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건물을 돌아 창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건물 한쪽 구석에 내동댕이쳐 있는 버려진 의자를 창문 아래 갖다 놓고 조심스레 의자를 밟고 올라서자 창고 안의 모습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다.
‘헉!’
뒷모습이 보이는 엄마는 시커먼 커다란 테이블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 신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그 아래로 기영이 엄마의 사타구니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아아아~ 안돼 기영아~ 나… 나, 가야 돼~ 하아아~”
엄마가 애써 기영의 머리를 밀어내자 기영이 엄마의 애액을 묻혀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었다.
“둘이 있을 땐 반말하지 말래도 또 반말한다. 그리고 솔직히 학교에 왜 왔어?
나 보러 온 거 아냐?
한 이틀 못 보니까 내 자지 생각 나서 온 거 아니냐고.”
“아… 아냐. 한주 담임 선생님 만나느라고… 하아아~.”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영이 다시 머리를 박았다.
몇 번 기영의 머리를 밀쳐내던 엄마의 손이 어느새 기영의 머리를 움켜쥐고는 오히려 자신의 아랫도리로 바짝 끌어 당기며 가쁜 숨을 몰아 쉬기 시작했다.
“하아아아~~ 아~ 나… 난.. 몰라~”
쭙쭙 거리며 엄마의 사타구니를 빠는 소리가 벌어진 창문 틈 사이로 흘러나와 한주의 귀에 꽂혔다.
기영의 머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며 어깨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엄마의 계곡 사이로 손가락을 넣는 것 같았다.
“아아아~~~ 아우~ 몰라~ 그… 그만~ 손을… 다 넣으면 어떡해…. 아아아~~”
엄마가 숨을 몰아 쉬며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자
한주의 눈엔 엄마의 다리 사이로 손목까지 다 들어간 기영의 팔이 보였다.
기영이 손을 꽂은 채 상체를 위로 올리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기영의 얼굴을 부여잡고 혀를 내밀어 기영의 입을 맞이했다.
“맨날 안 된다면서 이 물 나오는 것 좀 봐. 킬킬…”
기영이 손을 빼자 엄마의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팔뚝을 타고 줄줄 흘러 내렸다.
기영이 허리띠를 끄르자 엄마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지 위로 솟아오른 봉우리에 얼굴을 대고 비벼대던 엄마가 지퍼를 내리자 기영의 큼지막한 남근이 튕겨 나왔다.
고개를 들어 기영의 얼굴을 올려보던 엄마가 기영의 우람한 자지를 입에 넣었다.
한주는 갑자기 이상한 치욕감에 사로잡혔다.
양아치 같은 친구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자지를 입안 가득 정성스럽게 빨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한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몸이 꼬일 지경이었다.
얼마를 그랬을까
기영이 엄마를 일으켜 세워 테이블을 잡게 하고는 뒤에서 엉덩이 위로 치마를 걷어 올리며 자지를 갖다 댔다.
“허억!!”
두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있는 엄마의 고개가 위로 젖혀졌고 때를 같이 해 기영이 엄마의 흰 엉덩이를 움켜 쥐고는 슬슬 허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아아아~~ 아아~~ 여… 여보~~~ 아아~”
엄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기영이 점점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엄마의 희고 탐스런 엉덩이를 찰싹 찰싹 때리며 움켜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던 기영이 엄마를 돌려 세워 다시 테이블 위로 앉게 하고는 다시 계곡 사이로 자지를 밀어 넣었다.
“아아아~~ 자기야~~ 더… 더… 세게… 아아아~~ 고… 고마워… 아아아~~”
여기가 아들의 학교라는 사실도 잊었는지 기영의 머리를 잡고 얼굴과 목 구석구석에 입을 맞추며 쾌락에 겨운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는지 한주가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교실을 향해 몸을 돌릴 때 쯤 5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교실로 돌아오는 화단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들이 뿜어내는 진한 향기가 점점 멀어지는 엄마의 신음소리를 휘감아 하늘로 퍼졌다.
그렇게 6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일본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전용선 깔린 곳도 거의 없고 소라에 접속도 잘 안되더군요.)
제 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은 채
채 풀리지도 않은 여독을 뒤로 하고 바로 PC 앞에 앉게 되네요.(4부는 짧게 올리겠습니다.)
외국 다녀온 일들을 정리 하느라 연초는 정신이 없을테고 세째 주에 다시 일본에 열흘정도 다녀 와야겠기에
글을 자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짬 나는대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댓글과 쪽지로 힘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친구에게 빼앗긴 엄마 - 네번째 이야기
때를 모르고 찾아온 매미들의 이른 울음 소리 때문일까?
6월의 끝자락으로 접어들면서 날씨는 벌써 완연한 여름을 느끼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시장 통을 방불케 했고 그 한편에 한주가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야, 최 한주. 너 밥 안 먹어?”
“별로 생각 없어. 내 꺼 니네가 다 먹어.”
“너 요새 왜 그래? 꼭 정신 나간 애 같애. 벌써 더위 먹었냐?”
기영과 엄마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후 한주의 머리는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영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엄마에게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아니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던 한주의 눈에 낯익은 차 한대가 들어왔다.
학교 울타리 밖으로 골목에 주차 되어있는 하얀색 벤츠였다.
‘엄마가?…’
순간 한주는 무엇에 홀린 듯 교실을 빠져나가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울타리 밖으로 보이는 승용차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번의 불길한 예감이 한주의 머리를 스쳤다.
운동장을 단숨에 가로질러 학교로 다시 들어온 한주가 옆의 반의 기영을 찾았다.
역시 기영은 4교시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어떡하지? 찾아봐야 되나?’
계단을 내려오던 한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영의 아지트인 미술실 옆에 있는 미술 재료 창고로 향했다.
미술실이 본관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있어서 기영과 몇몇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담배도 피우고 수업도 땡땡이 치던 곳이었다.
창고에 조금씩 가까이 다다르자 나지막이 속삭이는 사람의 소리가 점점 선명히 들리기 시작했다.
한주가 창고의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역시
기영과 엄마의 목소리였다.
순간 한주는 가슴이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건물을 돌아 창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건물 한쪽 구석에 내동댕이쳐 있는 버려진 의자를 창문 아래 갖다 놓고 조심스레 의자를 밟고 올라서자 창고 안의 모습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다.
‘헉!’
뒷모습이 보이는 엄마는 시커먼 커다란 테이블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 신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그 아래로 기영이 엄마의 사타구니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아아아~ 안돼 기영아~ 나… 나, 가야 돼~ 하아아~”
엄마가 애써 기영의 머리를 밀어내자 기영이 엄마의 애액을 묻혀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었다.
“둘이 있을 땐 반말하지 말래도 또 반말한다. 그리고 솔직히 학교에 왜 왔어?
나 보러 온 거 아냐?
한 이틀 못 보니까 내 자지 생각 나서 온 거 아니냐고.”
“아… 아냐. 한주 담임 선생님 만나느라고… 하아아~.”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영이 다시 머리를 박았다.
몇 번 기영의 머리를 밀쳐내던 엄마의 손이 어느새 기영의 머리를 움켜쥐고는 오히려 자신의 아랫도리로 바짝 끌어 당기며 가쁜 숨을 몰아 쉬기 시작했다.
“하아아아~~ 아~ 나… 난.. 몰라~”
쭙쭙 거리며 엄마의 사타구니를 빠는 소리가 벌어진 창문 틈 사이로 흘러나와 한주의 귀에 꽂혔다.
기영의 머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며 어깨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엄마의 계곡 사이로 손가락을 넣는 것 같았다.
“아아아~~~ 아우~ 몰라~ 그… 그만~ 손을… 다 넣으면 어떡해…. 아아아~~”
엄마가 숨을 몰아 쉬며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자
한주의 눈엔 엄마의 다리 사이로 손목까지 다 들어간 기영의 팔이 보였다.
기영이 손을 꽂은 채 상체를 위로 올리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기영의 얼굴을 부여잡고 혀를 내밀어 기영의 입을 맞이했다.
“맨날 안 된다면서 이 물 나오는 것 좀 봐. 킬킬…”
기영이 손을 빼자 엄마의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팔뚝을 타고 줄줄 흘러 내렸다.
기영이 허리띠를 끄르자 엄마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지 위로 솟아오른 봉우리에 얼굴을 대고 비벼대던 엄마가 지퍼를 내리자 기영의 큼지막한 남근이 튕겨 나왔다.
고개를 들어 기영의 얼굴을 올려보던 엄마가 기영의 우람한 자지를 입에 넣었다.
한주는 갑자기 이상한 치욕감에 사로잡혔다.
양아치 같은 친구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자지를 입안 가득 정성스럽게 빨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한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몸이 꼬일 지경이었다.
얼마를 그랬을까
기영이 엄마를 일으켜 세워 테이블을 잡게 하고는 뒤에서 엉덩이 위로 치마를 걷어 올리며 자지를 갖다 댔다.
“허억!!”
두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있는 엄마의 고개가 위로 젖혀졌고 때를 같이 해 기영이 엄마의 흰 엉덩이를 움켜 쥐고는 슬슬 허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아아아~~ 아아~~ 여… 여보~~~ 아아~”
엄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기영이 점점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엄마의 희고 탐스런 엉덩이를 찰싹 찰싹 때리며 움켜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던 기영이 엄마를 돌려 세워 다시 테이블 위로 앉게 하고는 다시 계곡 사이로 자지를 밀어 넣었다.
“아아아~~ 자기야~~ 더… 더… 세게… 아아아~~ 고… 고마워… 아아아~~”
여기가 아들의 학교라는 사실도 잊었는지 기영의 머리를 잡고 얼굴과 목 구석구석에 입을 맞추며 쾌락에 겨운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는지 한주가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교실을 향해 몸을 돌릴 때 쯤 5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교실로 돌아오는 화단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들이 뿜어내는 진한 향기가 점점 멀어지는 엄마의 신음소리를 휘감아 하늘로 퍼졌다.
그렇게 6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