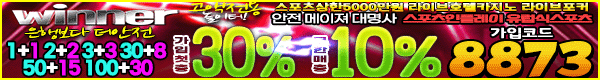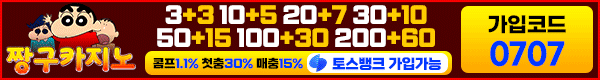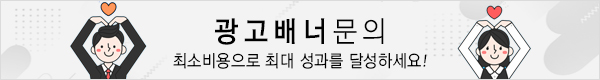빛 바랜 시간들 - 1부3장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132 조회
-
목록
본문
빛 바랜 시간들경숙의 생각- 2
경숙은 맥주 두 캔을 먹고 나니 맘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잠시 앉아서 혼자 히죽거렸다.
"내가 취했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술을 먹고나니 날씨 탓인지 술 탓인지
후덥지근해서 시원한 물을 뒤집어 쓰고 싶었다.
가게를 내고 물건 들여 놓고 나니 전세값이 넉넉치 못해
시 외곽 변두리에 집을 얻었는데 실내에 화장실도 목욕탕도 없었다.
부엌이 넓어 거기서나마 물을 받아 샤워를 하는 것이 다행이었다.
물을 틀고 천천히 옷을 벗었다.
흰색 면티를 머리 위로 벗어 올렸다.
흰색의 레이스가 달린 정숙한 브래지어가 나타났다.
브래지어는 정숙했지만 그 크기는 결코 정숙해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집에서 입는 헐렁한 치마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역시 하얀색 팬티가 비교적 가는 허리 아래로 나타났다.
치마가 더 내려가자 살집에 제법 있는 멋진 허벅지가 나타났다.
내려간 치마를 발에서 벗겨내어 부엌에 매여진 빨래줄에 걸고
빨래줄에 널려 있던 수건을 걷어서 머리를 묶었다.
머리를 묶던 경숙의 눈에 열려진 창문이 보였다.
한 번도 창문을 열고 옷을 벗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술을 마신 탓인지
아니면 하루 내내 좋지 못했던 일진 탓인지 창문을 닫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술 탓인지 그녀는 대범해졌다.
"지지리 복도 없는 몸뚱아리 누가 봐주기나 하겠어....
본들 또 어때, 닳을 것도 아닌데....볼테면 보라지"
그녀는 그냥 브래지어 호크를 풀었다.
그순간 종일 갇혀있던 큰 유방이 탈출이라도 할 기세로 튕겨져 나왔다.
튕겨져 나온 유방은 크게 좌우, 상하로 흔들렸다.
경숙은 자신의 리듬미컬하게 흔들리는 유방을 잠시 내려다 보았다.
"휴~~"
한 숨이 절로 나왔다.
뒤이어 몸을 숙이고 팬티를 내리기 시작했다.
풍만한 엉덩이에 겨우 걸린 듯한 흰 팬티가 서서히 내려갔다.
배꼽 조금 아래부터 시작된 그녀의 방초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춘기가 지나고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한 그녀의 보지털은 그녀가
여고 1학년이 되었을 쯤 이미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의 보지털의 길이나 빽빽함, 그리고 그것이 덮은 넓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안 뒤, 한동안 목욕탕도 가지 못했다.
지금도 여름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겨울에만 가끔 새벽에 일찍 다녀 오곤 한다.
그녀는 자신의 보지털을 보다가 문득 옆집 성주가 생각이 났다.
그 이른 새벽에 그녀가 목욕을 하러 올 줄은 몰랐다.
그녀와 안면은 있었지만 트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였는데
그날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났다.
그녀가 먼저 아는 척만 안 했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과부인 것을 스스럼없이 밝혔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
자신의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털털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경숙은 끌렸다.
그래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이 곳에 와서 서로 오가는 첫 이웃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길은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가슴을 훑으며 커지기 시작한 성주의 눈이
자신의 아랫도리로 향했을 때 경숙은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다.
그렇게 한동안 경숙의 몸을 훑던 성주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민망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경숙에게 찬사를 보냈다.
"정말 멋진 몸을 가시셨네요...
여자인 내가 보아도 넋이 나갈만큼요."
경숙을 알몸을 본 어떤 여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다만 위 아래로 훑어 보다가 자기들끼리 쑥떡거릴 뿐이었다.
그들이 칭찬을 했든, 흉을 보았든 서로 경숙 몰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앞 뒤로 슬쩍슬쩍 지나가며 훑었을 때 느꼈던 모멸감을 그녀는 지금껏 기억한다.
다시 성주의 눈길이 그녀를 훑어 간다.
그러다 난감해 하는 경숙의 눈과 마주쳤다.
"아, 미안해요.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네요..
여자가 여자 몸에 눈이 가다니...저도 첨이예요..호호"
그녀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는 소탈하게 웃는다.
경숙의 나빴던 기분을 가라 앉혀주는 그런 웃음이다.
정말 기분 좋은 그녀의 웃음과 아무런 숨김없이
해맑게 웃는 모습에 그녀는 맘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쩌죠?....자꾸 눈길이 가서..호호홋"
그녀는 다시 맑게 높게 웃으며 무슨 이유에선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활짝 웃는 얼굴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사실 그 쪽 몸이 무척 부럽네요...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저 몸이 내 꺼라면....호호홋"
"......."
경숙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저도 제 몸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경숙도 맘속으로 그녀의 몸에 감탄을 하고 있었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몸이였다.
적당히 풍만한 가슴,
미끄러지듯 내려간 배,
잘룩한 허리,
아름답게 솟아 오른 엉덩이 선,
그리고 짧고 부드러운 털로 덮힌 둔덕....
경숙이 갖고 싶었던 그런 몸매였다.
"어디 가서 부러움을 샀으면 샀지, 부러워 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쪽 몸이 너무 부러워요."
경숙은 성주의 말에 의아해 했다.
"놀리지 말아요. 저는 오히려 그 쪽이 부러운데요."
"그럼, 우리 바꿀까요?"
성주는 그 말을 하고 예의 또 그 높고 맑은 웃음을 웃었다.
웃음소리는 목욕탕 안을 울려 갔다.
그렇게 둘은 친해졌다.
성주의 기분 좋은 웃음을 떠올리며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물이 더워진 몸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경숙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그 기분을 만끽하며 천천히 머리를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목에서부터 물을 천천히 부었다.
목을 타고 내려가던 물은 가슴에서 크게 굽이치며
언덕을 미처 넘지 못하고 계곡으로 몰려 들었다.
물의 애무를 받으며 그녀는 약간 더 들뜨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한동안 자신의 몸에 물을 부으며 물의 희롱을 즐기던 그녀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그녀의 눈은 꿈에 잠긴 듯 기분좋은 몽롱함에 잠긴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부엌 백열전등이 보였고,
부엌 천정에 흰색 페인트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이어 커다란 부엌 창문을 통해 밖에 그득한 어둠이 보였다.
"어?"
순간, 경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뭘까?"
잠시 그녀는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닫을까?"
그녀는 일어났다.
그때,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밤바람이 흘러들어와 그녀의 몸을 감싸고 돌았다.
그것은 또다른 느낌이었다.
바람은 그녀의 긴 목을 스쳐갔고
그녀의 개방된 두 젖가슴을 지나갔다.
그녀의 유륜(젖바퀴)에 숨어 있던 소름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의 커다란 젖가슴에 묻혀있던 작은 젖꼭지도 덩달아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건 유혹이었다.
"아!"
그녀는 작게 신음을 뱉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다.
그녀의 다리에는 힘이 빠지면서 야릇하고 따뜻한 느낌이 감싸여 왔다.
천천히...천천히...그녀는 다시 주저 앉았다.
부엌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밤바람은 계속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애무해 갔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바람에 반응했다.
그녀의 가슴은 크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도톰하고 물기에 젖은 입술은 조금씩 벌어졌다.
경숙은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긴 채 모두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짙은 수풀이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 음모 하나하나를 만지듯 스쳐갔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점점 더 넓게 다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검은 음모들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샘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샘의 원천인 그녀의 비밀스런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벌어진 입술로 검지 손가락을 아주 조금 밀어 넣었다.
입속에는 침으로 젖은 혀가 말라붙는 입 천장을 적시기 위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경숙은 그 혀에 손가락을 천천히 대어 보았다. 부드러운 느낌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왔다.
손가락과 혀는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인양 각각 서로 다른 느낌이 전해왔다.
경숙은 조금더 격렬하게 혀를 굴려 손가락을 감싸고 돌았다.
"아!"
신음이 입 밖으로 다시 새어 나왔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각보다 큰 신음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감짝 놀라 눈을 뜬 그녀는 창밖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기에는...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당황하고 있었다.
사내의 놀란 눈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어둠을 응시하던 경숙은 사내의 출현보다
너무도 침착한 자신에게 놀라기 시작햇다.
"왜..."
그랬다. 자신이 전혀 당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그녀는 더욱 당황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조차도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았다.
마치 명상이라도 마친 듯 너무도 평온했다.
얼굴조차 명확치 않는 그 상황에서 사내의 눈동자만은 정확히 보였다.
어둠 속에서 갈색으로 빛나던 그 눈...
그녀는 그 눈이 왠지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의 목욕하는 몸을 훔쳐보는 탐욕스러움이 아니라
외로움에 지쳐 먼 하늘을 응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몸에 물을 끼얹으며 자신에게 몰입해 갔다.
경숙은 맥주 두 캔을 먹고 나니 맘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잠시 앉아서 혼자 히죽거렸다.
"내가 취했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술을 먹고나니 날씨 탓인지 술 탓인지
후덥지근해서 시원한 물을 뒤집어 쓰고 싶었다.
가게를 내고 물건 들여 놓고 나니 전세값이 넉넉치 못해
시 외곽 변두리에 집을 얻었는데 실내에 화장실도 목욕탕도 없었다.
부엌이 넓어 거기서나마 물을 받아 샤워를 하는 것이 다행이었다.
물을 틀고 천천히 옷을 벗었다.
흰색 면티를 머리 위로 벗어 올렸다.
흰색의 레이스가 달린 정숙한 브래지어가 나타났다.
브래지어는 정숙했지만 그 크기는 결코 정숙해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집에서 입는 헐렁한 치마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역시 하얀색 팬티가 비교적 가는 허리 아래로 나타났다.
치마가 더 내려가자 살집에 제법 있는 멋진 허벅지가 나타났다.
내려간 치마를 발에서 벗겨내어 부엌에 매여진 빨래줄에 걸고
빨래줄에 널려 있던 수건을 걷어서 머리를 묶었다.
머리를 묶던 경숙의 눈에 열려진 창문이 보였다.
한 번도 창문을 열고 옷을 벗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술을 마신 탓인지
아니면 하루 내내 좋지 못했던 일진 탓인지 창문을 닫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술 탓인지 그녀는 대범해졌다.
"지지리 복도 없는 몸뚱아리 누가 봐주기나 하겠어....
본들 또 어때, 닳을 것도 아닌데....볼테면 보라지"
그녀는 그냥 브래지어 호크를 풀었다.
그순간 종일 갇혀있던 큰 유방이 탈출이라도 할 기세로 튕겨져 나왔다.
튕겨져 나온 유방은 크게 좌우, 상하로 흔들렸다.
경숙은 자신의 리듬미컬하게 흔들리는 유방을 잠시 내려다 보았다.
"휴~~"
한 숨이 절로 나왔다.
뒤이어 몸을 숙이고 팬티를 내리기 시작했다.
풍만한 엉덩이에 겨우 걸린 듯한 흰 팬티가 서서히 내려갔다.
배꼽 조금 아래부터 시작된 그녀의 방초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춘기가 지나고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한 그녀의 보지털은 그녀가
여고 1학년이 되었을 쯤 이미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의 보지털의 길이나 빽빽함, 그리고 그것이 덮은 넓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안 뒤, 한동안 목욕탕도 가지 못했다.
지금도 여름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겨울에만 가끔 새벽에 일찍 다녀 오곤 한다.
그녀는 자신의 보지털을 보다가 문득 옆집 성주가 생각이 났다.
그 이른 새벽에 그녀가 목욕을 하러 올 줄은 몰랐다.
그녀와 안면은 있었지만 트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였는데
그날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났다.
그녀가 먼저 아는 척만 안 했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과부인 것을 스스럼없이 밝혔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
자신의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털털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경숙은 끌렸다.
그래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이 곳에 와서 서로 오가는 첫 이웃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길은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가슴을 훑으며 커지기 시작한 성주의 눈이
자신의 아랫도리로 향했을 때 경숙은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다.
그렇게 한동안 경숙의 몸을 훑던 성주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민망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경숙에게 찬사를 보냈다.
"정말 멋진 몸을 가시셨네요...
여자인 내가 보아도 넋이 나갈만큼요."
경숙을 알몸을 본 어떤 여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다만 위 아래로 훑어 보다가 자기들끼리 쑥떡거릴 뿐이었다.
그들이 칭찬을 했든, 흉을 보았든 서로 경숙 몰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앞 뒤로 슬쩍슬쩍 지나가며 훑었을 때 느꼈던 모멸감을 그녀는 지금껏 기억한다.
다시 성주의 눈길이 그녀를 훑어 간다.
그러다 난감해 하는 경숙의 눈과 마주쳤다.
"아, 미안해요.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네요..
여자가 여자 몸에 눈이 가다니...저도 첨이예요..호호"
그녀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는 소탈하게 웃는다.
경숙의 나빴던 기분을 가라 앉혀주는 그런 웃음이다.
정말 기분 좋은 그녀의 웃음과 아무런 숨김없이
해맑게 웃는 모습에 그녀는 맘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쩌죠?....자꾸 눈길이 가서..호호홋"
그녀는 다시 맑게 높게 웃으며 무슨 이유에선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활짝 웃는 얼굴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사실 그 쪽 몸이 무척 부럽네요...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저 몸이 내 꺼라면....호호홋"
"......."
경숙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저도 제 몸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경숙도 맘속으로 그녀의 몸에 감탄을 하고 있었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몸이였다.
적당히 풍만한 가슴,
미끄러지듯 내려간 배,
잘룩한 허리,
아름답게 솟아 오른 엉덩이 선,
그리고 짧고 부드러운 털로 덮힌 둔덕....
경숙이 갖고 싶었던 그런 몸매였다.
"어디 가서 부러움을 샀으면 샀지, 부러워 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쪽 몸이 너무 부러워요."
경숙은 성주의 말에 의아해 했다.
"놀리지 말아요. 저는 오히려 그 쪽이 부러운데요."
"그럼, 우리 바꿀까요?"
성주는 그 말을 하고 예의 또 그 높고 맑은 웃음을 웃었다.
웃음소리는 목욕탕 안을 울려 갔다.
그렇게 둘은 친해졌다.
성주의 기분 좋은 웃음을 떠올리며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물이 더워진 몸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경숙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그 기분을 만끽하며 천천히 머리를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목에서부터 물을 천천히 부었다.
목을 타고 내려가던 물은 가슴에서 크게 굽이치며
언덕을 미처 넘지 못하고 계곡으로 몰려 들었다.
물의 애무를 받으며 그녀는 약간 더 들뜨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한동안 자신의 몸에 물을 부으며 물의 희롱을 즐기던 그녀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그녀의 눈은 꿈에 잠긴 듯 기분좋은 몽롱함에 잠긴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부엌 백열전등이 보였고,
부엌 천정에 흰색 페인트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이어 커다란 부엌 창문을 통해 밖에 그득한 어둠이 보였다.
"어?"
순간, 경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뭘까?"
잠시 그녀는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닫을까?"
그녀는 일어났다.
그때,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밤바람이 흘러들어와 그녀의 몸을 감싸고 돌았다.
그것은 또다른 느낌이었다.
바람은 그녀의 긴 목을 스쳐갔고
그녀의 개방된 두 젖가슴을 지나갔다.
그녀의 유륜(젖바퀴)에 숨어 있던 소름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의 커다란 젖가슴에 묻혀있던 작은 젖꼭지도 덩달아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건 유혹이었다.
"아!"
그녀는 작게 신음을 뱉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다.
그녀의 다리에는 힘이 빠지면서 야릇하고 따뜻한 느낌이 감싸여 왔다.
천천히...천천히...그녀는 다시 주저 앉았다.
부엌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밤바람은 계속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애무해 갔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바람에 반응했다.
그녀의 가슴은 크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도톰하고 물기에 젖은 입술은 조금씩 벌어졌다.
경숙은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긴 채 모두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짙은 수풀이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 음모 하나하나를 만지듯 스쳐갔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점점 더 넓게 다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검은 음모들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샘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샘의 원천인 그녀의 비밀스런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벌어진 입술로 검지 손가락을 아주 조금 밀어 넣었다.
입속에는 침으로 젖은 혀가 말라붙는 입 천장을 적시기 위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경숙은 그 혀에 손가락을 천천히 대어 보았다. 부드러운 느낌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왔다.
손가락과 혀는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인양 각각 서로 다른 느낌이 전해왔다.
경숙은 조금더 격렬하게 혀를 굴려 손가락을 감싸고 돌았다.
"아!"
신음이 입 밖으로 다시 새어 나왔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각보다 큰 신음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감짝 놀라 눈을 뜬 그녀는 창밖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기에는...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당황하고 있었다.
사내의 놀란 눈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어둠을 응시하던 경숙은 사내의 출현보다
너무도 침착한 자신에게 놀라기 시작햇다.
"왜..."
그랬다. 자신이 전혀 당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그녀는 더욱 당황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조차도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았다.
마치 명상이라도 마친 듯 너무도 평온했다.
얼굴조차 명확치 않는 그 상황에서 사내의 눈동자만은 정확히 보였다.
어둠 속에서 갈색으로 빛나던 그 눈...
그녀는 그 눈이 왠지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의 목욕하는 몸을 훔쳐보는 탐욕스러움이 아니라
외로움에 지쳐 먼 하늘을 응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몸에 물을 끼얹으며 자신에게 몰입해 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